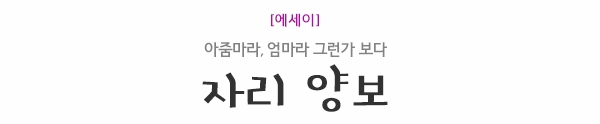

서울로 이사하고 7개월 된 아들과 첫 외출이 지인의 문병이었습니다.
지하철과 도보를 다 하여 1시간 예상.
가는 길에는 편안히 자리에 앉아 사람 구경도 하고, 천천히 발길을 떼고 있었습니다.
지하도를 지나 지상으로 올라오니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립니다.
우산 없이 외투로 아들의 머리를 감싸고 총총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낯선 우산이 우리 모자를 받쳐줍니다.
우연하게 그분도 나와 같은 병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니 초행길이 안심입니다.
축하와 안부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오후 4시경.
지하철은 사람들로 북적북적.
밀물, 썰물처럼 이리 붐볐다, 저리 붐볐다 하기를 반복합니다.
텁텁한 기운에 지하철 안을 장식하고 있는 무채색의 얼굴들.
그 속에 유채색의 나와 아들이 들어섰습니다. 물론 7개월의 아들 때문에 유채색이 되었습니다.
앉을 자리 없이 어리둥절한 눈과 몸으로 서 있는데 어깨에 짐을 메고 있는 아주머니가
“애기 엄마 여기 앉아요. 힘들 텐데.”
그 순간 할아버지께서 털썩 앉으십니다.
서로 멋쩍은 웃음을 주고받습니다.
다시 자리가 나자, “애기 엄마 앉아요.”
친절한 아주머니 덕분에 편안하게 앉아서 집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고서 가만히 아주머니를 보니 본인도 짐이 두 개나 있어 힘들 터인데,
내게 자리를 양보해 주셨습니다.
고마운 마음입니다.
‘서울 깍쟁이도 아직 자리 양보의 미덕은 남아 있나 보다.’ 생각하다,
‘아니다, 아줌마라, 엄마라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아기를 안고 다녀 보았기에 안쓰러워 그렇게 자리를 양보해 주셨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 조회수
- 14,411
- 좋아요
- 0
- 댓글
- 3
- 날짜
- 2013/11/07









